【건강다이제스트 | 서진아 애독자】

늦둥이로 여아 쌍둥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가 짧았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이들의 일과를 좇다 보면 내 생활은 없었다. 나 역시 늦둥이였던지라 연로하고 노쇠한 어머니께서 나를 도와줄 수도, 내가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쌍둥이를 돌보면서 초교 다니는 큰아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면 피곤은 겹겹이 쌓여 잠을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어느 일요일 오전, 남편이 아이들을 봐준다기에 오랜만에 늦잠을 자보겠구나 했다. 그런데 그날 내내 일어나질 못했다. 눈을 뜨려고 하는 나를 거대한 검은 물체가 짓밟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남편 역시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는 내 상태가 심상찮다고 여겼고 서둘러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를 전하는 의사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귀에 꽂혔다. 갑상선암!
‘암’이라는 말만큼 폭력적인 단어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그 와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직 어린 늦둥이들이었다. 그리고 찾아온 엄청난 공포!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잠이 오지 않았다.
당시 매스컴에서는 갑상선암 수술이 지나치게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갑상선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병을 큰 병으로 만든다는 말처럼 들렸다. 마치 내게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꾸짖는 것처럼 들렸다. 지금도 그렇다. 내가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걱정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망설였다. 자연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과 아직 엄마 손이 절실히 필요한 늦둥이들 때문에. 이제 막 돌이 지난 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느리게 진행되는 암이고 완치율도 높다고 하니 일 년 정도는 수술을 미루고 싶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다. 암 위치가 편도와 가까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병을 키우기보다 지금 수술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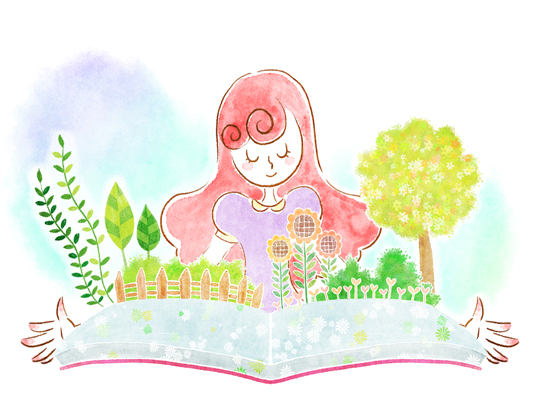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망설이던 내가 수술을 결정한 것은 온전히 남편 덕분이었다. 남편이 일주일 휴가를 냈다. 그러자 큰아들도 학원을 쉬며 아빠를 돕겠다고 나섰다. 집안일은 두 부자가 도맡았고 늦둥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냈다. 세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해야 했던 남편은 내 염려와 달리 불평불만 없이 내 몫의 일을 해주었다. 또한, 병실에 누워있는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늘 웃으며 간호를 해줬다. 내가 암을 만난 이후 우리 집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육아와 집안일을 엄마 일로만 여겼던 과거와 달리 이젠 누구랄 것도 없이 스스로 필요한 일을 해낸다.
불안으로 떠는 내 손을 힘껏 잡아주던 남편의 그 따뜻한 손은 내게 삶의 의지를 갖게 했다. 엄마, 아내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험한 우리는 서로 더 이해하고 더 힘껏 껴안는 가족이 되었다.
암을 만나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건강을 나이 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로만 여겼던 나의 방심과 자만이 부끄러웠고, 엄마로서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전에는 마트에서 사다 먹던 음식들을 요즘은 직접 만들어 먹는다. 하나씩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온 힘을 다한다.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질 거라 확신한다. 그러다 보면 나도 어엿한 가족건강지킴이가 될 것이다.
<독자원고를 기다립니다>
● 주제는 자유이며, 사는 이야기를 적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은 A4 1~2장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해요~
● 보낼 곳 : 건강다이제스트 편집국 독자투고 담당자
● 04317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70길 46 (효창동, 대신빌딩3층) 건강다이제스트
● e-mail : diegest@chol.com / 문의 : 02-702-6331